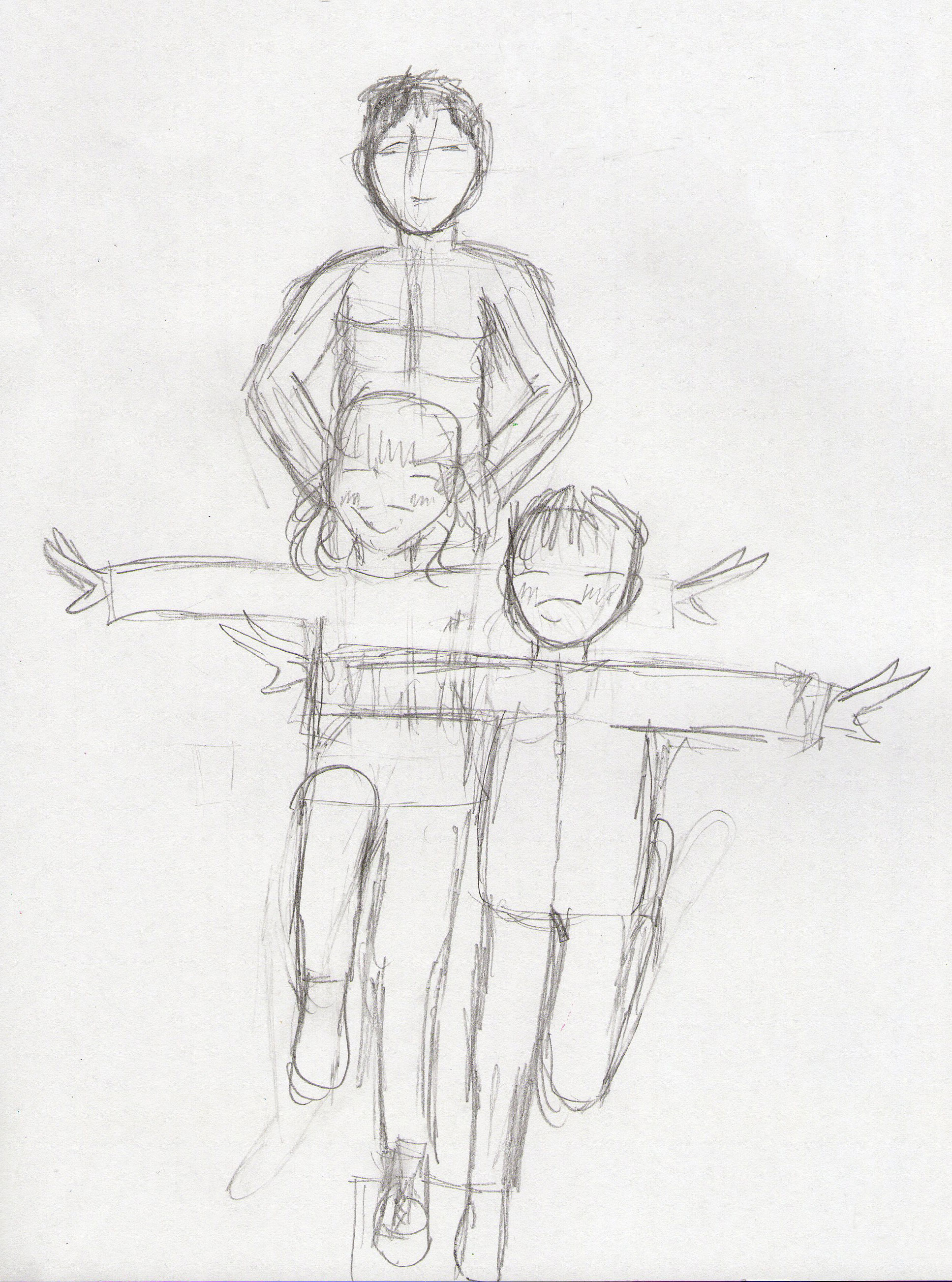5시 30분이면 저녁 먹기 전이라 밖에 잘 안나간다.
보통은 간식을 조금 먹고 놀다가 6시 조금 넘어서 저녁을 먹는다.
우리집 생활은 대게 규칙적인 편이다.
그런데 둘째가 갑자기 젠가를 하고 싶다고 했다.
오늘은 왠지 나도 원하는 걸 해주고 싶었다.
둘째는 화려한 거 좋아하고 치장하는 것 좋아하는 아가씨인데
우리집이 긴축 모드라서 원하는대로 해주지 못했었다.
'그래 기분이다.'
"젠가 사러 가자 ^^"
갑자기 아이 눈이 동그랗게 커진다.
"예~! 가자~~"
문제는 막내다. 요즘따라 행동이 너무 굼뜨다.
나가려면 옷 갈아입기 관문이 있는데 10분을 기다려도 그대로다.
빨리 움직이라고 했더니 화장실에서 주방을 빠르게 뛰어다닌다.
결국 내 인내심에 한계가 왔다.
"지금 안 나가면 집에 두고 갈꺼야!"
막내는 울음을 터트린다.
"울고 싶은 만큼 울고 멈추기"
울음을 가장 빨리 멈추게 하는 마법 주문이다.
우여곡절 끝에 집을 나섰다.
요즘 웬만하면 다 자유롭게 놔둔다.
그런데 골목에서 걸음이 또 문제다.
둘째는 앞에 막내는 뒤에 있다.
'에잇, 안되겠다.'
결국 한 손에 한 명씩 손을 붙잡고 걸어간다.
조금 편안한가 했더니 막내가 또 멈춰선다.
"아빠, 신발 바닥에 뭐가 들었어요."
"아빠 붙잡고 신발 벗어 봐."
"바닥이 그냥 좀 울퉁불퉁한 거야"
"아~ 바닥에 있는 게 올라온 거에요?"
이제야 안심이 되나보다.
다시 신발을 신고 횡단보도를 건넜다.
"어? 아빠가 지나가니까 차가 멈췄어요"
아이 눈에는 마치 내가 차를 멈추기라도 한 것처럼 보이나 보다.
둘째는 처음에 모닝글로리에 가자고 했다.
전에 거기서 본 것 같다고 했다.
천천히 찾아보려다가 주인 아저씨에게 물어봤더니 작은 것 밖에 없다고 했다.
그냥 나오는데 막내가 문 앞에서 빗물에 미끄러져 넘어졌다.
아이를 얼른 붙잡고 일으켰다.
"누가 여기다 물을 뿌렸어!"
"하늘이지" 둘째가 대답한다.
"하늘 나빠!"
"하늘이 왜 나빠?"
"나 넘어지게 비 뿌렸으니까"
"비는 하늘에서 그냥 내린거야"
"비 나빠!"
"비가 왜 나빠? 목마른 사람한테 빗물 내리면 얼마나 좋은데."
"빗물 먹을 수 있어요? 먹어도 안 아파요?"
"응, 괜찮아"
"완전히 투명해야 돼죠?"
"응, 그렇지"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나보다.
근처의 다이소에 갔다.
"어디에 있을까요?"
둘째가 신나서 얘기한다.
"2층 장난감 있는데 있을거야."
나는 잘 못 찾겠는데 둘째가 금방 찾았다.
그런데 '젠가'가 아니고 '나무쌓기'이다.
"'젠가'아니어도 괜찮아?"
"괜찮아요"
둘째가 대답한다. 만족한 건지 실망한 건지 말투만으로는 알 수가 없다.
하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해보자면
- 요즘 트렌드인 '한국산'이고
- 나무 블럭에 숫자가 써있고 주사위도 같이 있어서 '젠가'보다 더 다양한 게임을 할 수 있다.
'나무 블럭'을 사서 1층으로 내려가려는데 갑자기 막내가
'어? 여기는 위에 올라가는 계단이에요?'한다.
"같이 가볼까?"
"네!"
평소에는 옷방이 깜깜해서 무섭다고 잘 안가는데 내가 같이 있으니 올라가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나보다.
2층을 실컷 구경하고 다이소를 나왔다.
돌아가는 길에 다시 막내랑 손을 잡으려는데 양쪽 주머니에 손을 찔러넣고 빼질 않는다.
이번에는 혼자 걷고 싶은가 보다.

다시 길을 건너 시장길을 가는데, 횟집 어항에 있는 장어를 보고는
"아빠! 얘 죽었어요!!"
언제나 처럼 엄청 큰 목소리로 얘기한다.
"죽은 거 아니고 자는 거야"
둘째가 알려준다. 내가 안 알려줘도 둘이서 잘한다.
다시 처음처럼 둘째는 앞에 막내는 뒤에 간다.
막내는 확실히 의사 표시를 했으니 둘째를 불러본다.
그랬더니 뒤돌아보고 예쁘게 기다려준다.
그렇게 둘이 손을 잡고 몇 발짝 걸었는데, 신난 목소리로
"아빠, 나 하얀 블럭만 밟고 가기 할꺼에요."
이제는 나도 손잡을 필요가 없다.
흐뭇한 마음으로 두 아이가 걸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따라왔다.